아서 클라인먼 지음, 노지양 옮김(2020), 『케어-의사에서 보호자로, 치매 간병 10년의 기록』, 서울 : (주)시공사, 초판1쇄 2020.5.25. 초판2쇄 220.6.5.
2021년 11월 6일(토)에 아서 클라인먼(Arthur Kleinman)의 『케어』를 읽었다. 원저는 2019년에 발행된 『The Soul of Care』이다. 우리말 번역본에는 “의사에서 보호자로, 치매 간병 10년의 기록”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우리말 책의 부제 때문에 책을 읽기 시작했으나, 앞의 반 정도만 알츠하이머 병으로 치매에 걸린 부인 조앤을 간병하는 이야기이다. 11장으로 구성된 책으로 앞의 5장까지가 치매에 걸린 조앤을 간병하는 이야기이고, 나머지 6개 장은 조앤과 저자의 생애사와 미국의 의료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한 책이다. 책을 빌린 월평도서관에는 치매 관련 책들이 별도의 서가에 진열되어 있다. 월평도서관이 치매 전문 도서관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책도 치매 관련 서가에 비치되어 있다.
책을 읽어가면서 번역본의 부제가 잘못되었다는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 것을 알게 되었다. 원서의 제목인 『The Soul of Care』에 대한 책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처음에 가졌던 기대감을 내려놓고 새로운 관점으로 책을 읽게 되었다. 알츠하이머 병의 단 5%만이 시각정보를 처리하는 뇌 영역인 후두엽에서 시작되는 치매에 걸린 부인을 간병한 경험을 계기로 의사인 저자가 의료계에 이슈를 던지는 책이라는 점이 더 맞는 것 같다. 책의 마지막에 실려 있는 ‘감사의 글’에서 저자가 말했듯이 이 책은 “가정의 주 간병인이자 돌보는 사람으로서 10여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썻지만 나의 평생의 이야기가 들어간 자서전이다”라는 말이 맞는 책이다.
환자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죄책감을 갖고 본인이 직접 돌보겠다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우리 세대의 환자 돌봄에 대한 의견과 같음을 알게 되었다. 미국의 요양보호사는 대부분 정식 간호사 자격증이 없고, 파견업체에서 나온 흑인 여성들이었다는 말을 듣고 미국의 돌봄 노동 분야에서 소수 인종 여성의 비율이 높은 점을 알 수 있었다. 미국에서 의사와 환자 간의 대화가 너무 부족하여 생기는 문제점들을 읽으며 단편적으로만 듣던 미국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조금은 알 것 같다.
“유대인(Yiddish) 속담에 부모가 아이를 도우면 둘다 웃지만, 아이가 부모를 도우면 둘다 운다”는 말에 크게 공감을 하였다. “요즘 사람들은 노인의료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살던 곳에서 노후 맞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는 말도 공감이 간다. 미국의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이야기 한 말로 “의사는 환자와 만나는 시간보다 보험회사 직원과 의료보험 관리자와 통화하는 시간이 많다”는 말을 들으며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더 실감하게 되었다. 지난 번에 지인의 요양보호사 치매교육 수강과 시험을 도와주면서 같이 공부했던 치매교육 수강 경험도 책을 읽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다음 주부터 60일동안 요양보호사 교육 240시간을 받고자 수강 신청한 나로서는 많은 도움이 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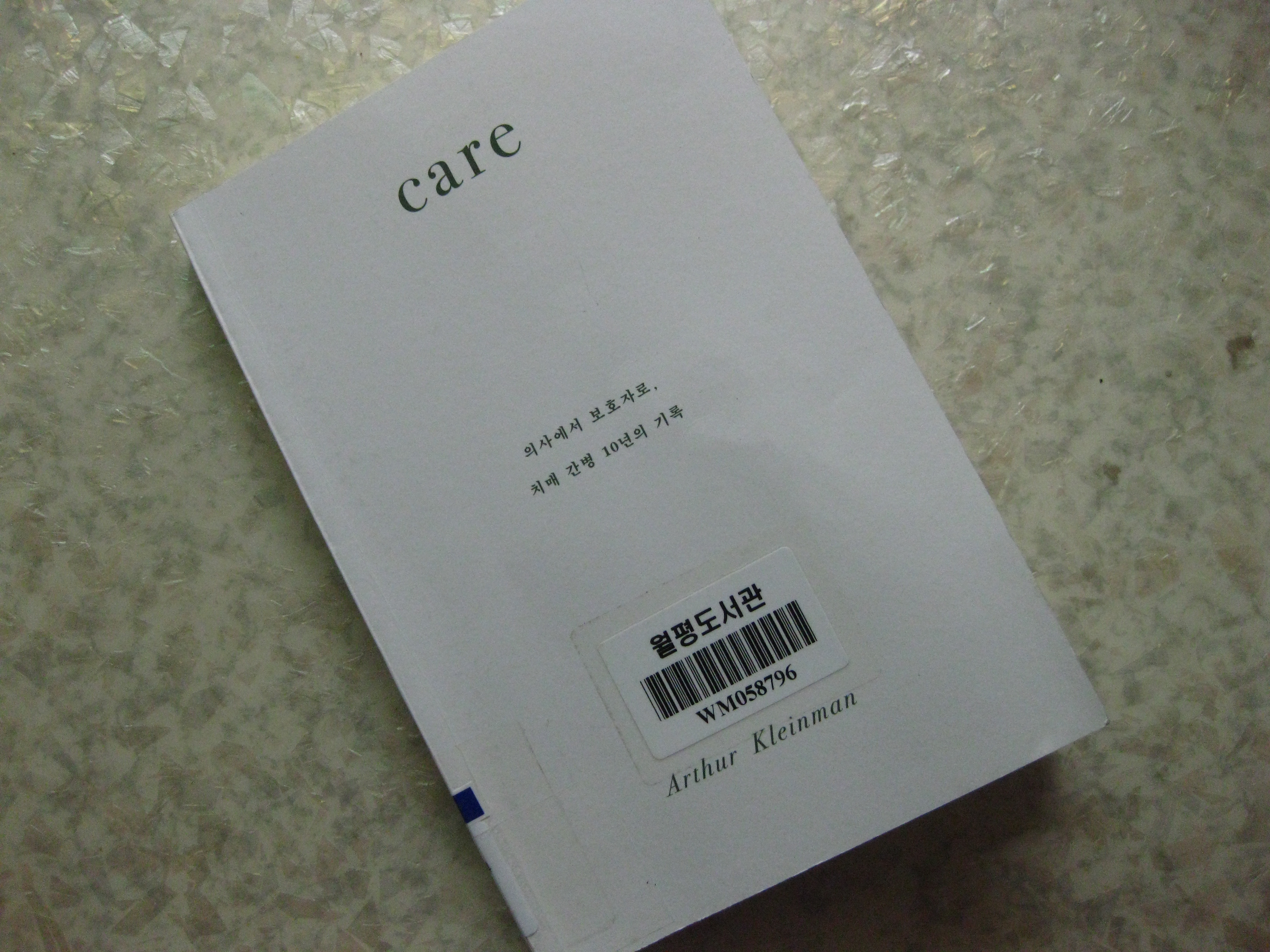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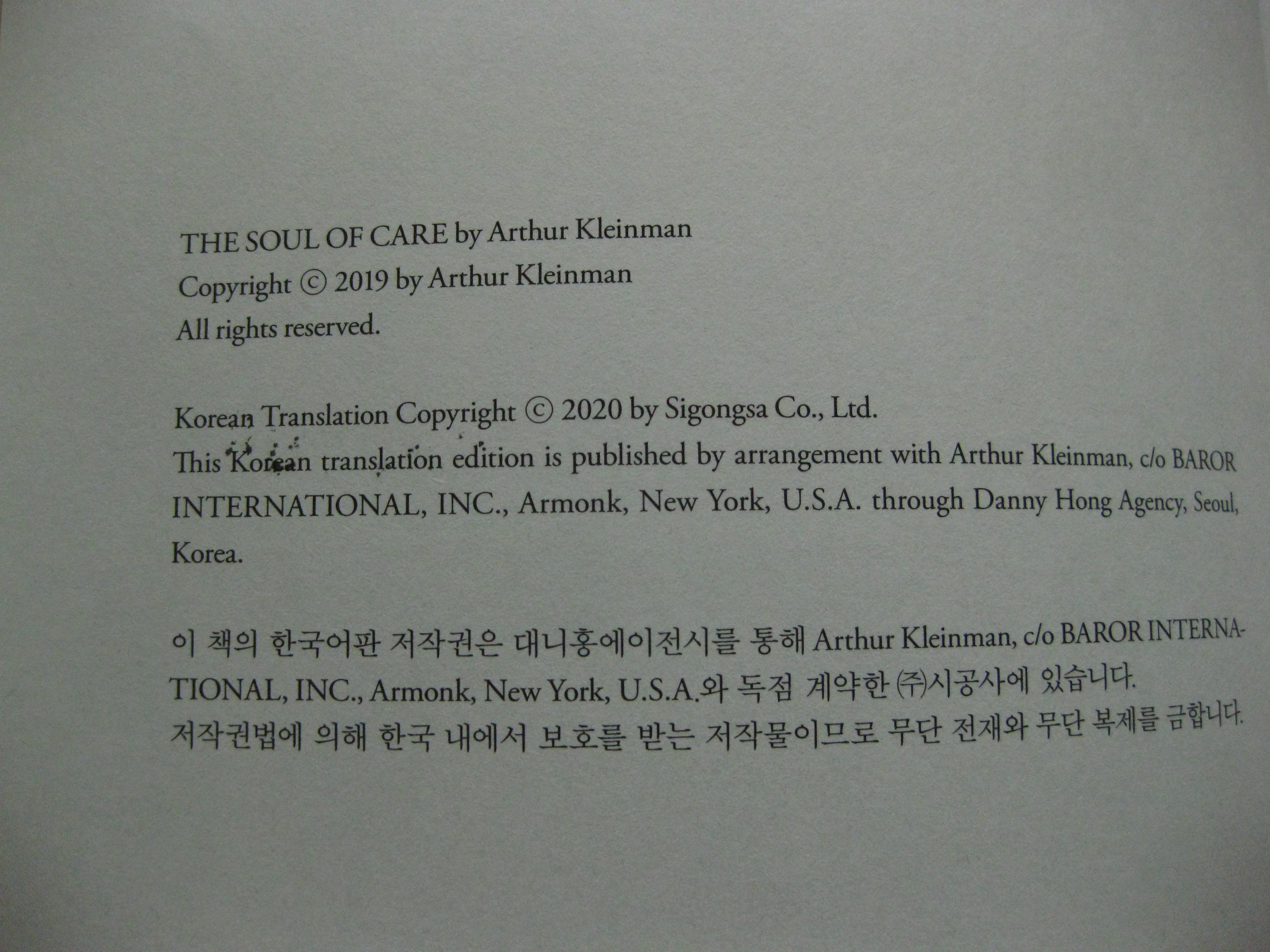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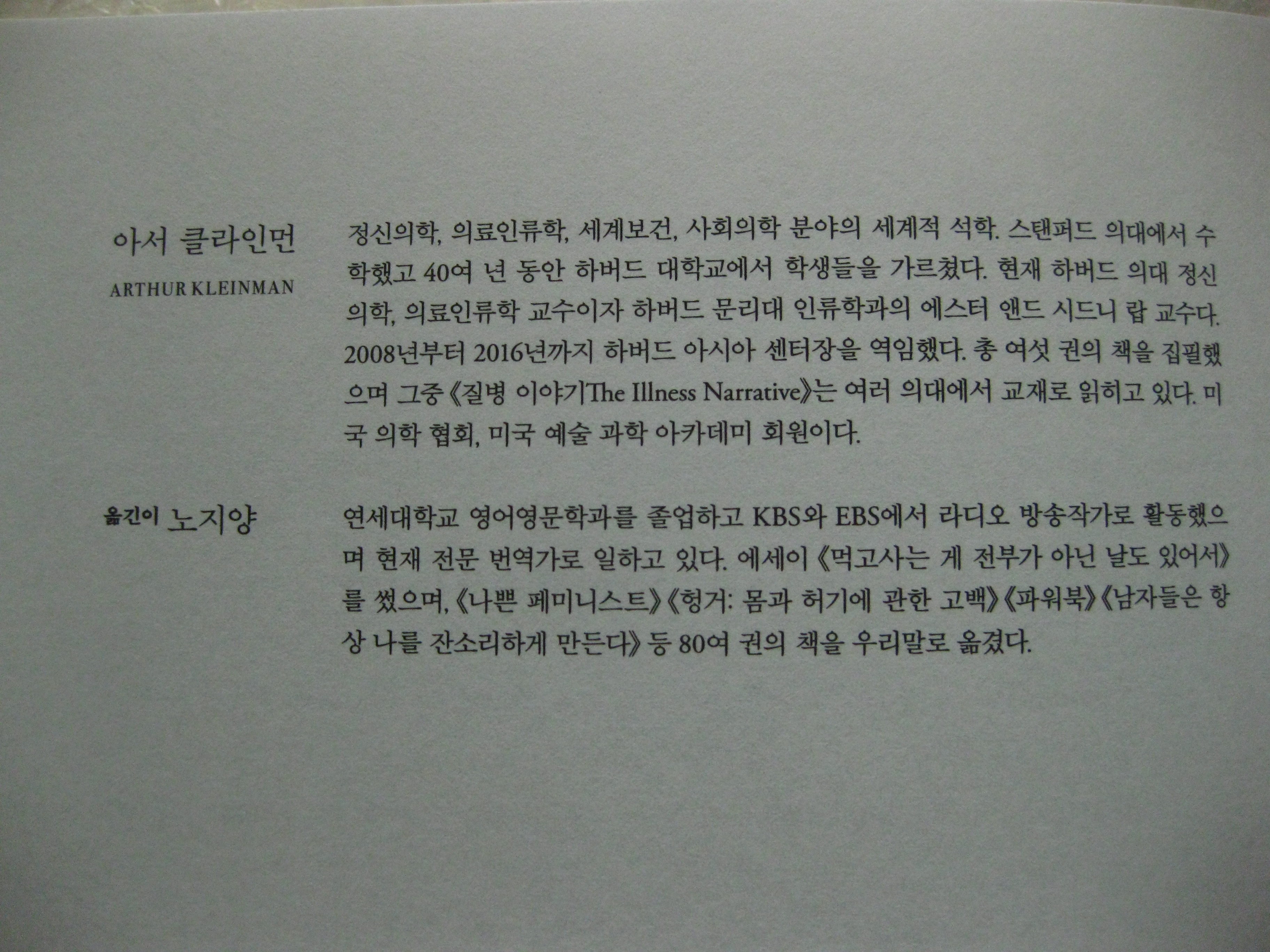

'배움의 기쁨 > 책속의 한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세상을 바꾼 어리석은 생각들』을 읽다. (0) | 2022.02.06 |
|---|---|
| 숀케 아렌스의 『제텔카스텐』을 읽다. (0) | 2022.01.21 |
| 고은 지음, 『고은 장편소설 화엄경』을 읽다. (0) | 2021.10.26 |
| 폴 샤레 지음, 『새로운 전쟁』을 읽다. (0) | 2021.09.23 |
| 송강 역해, 『송강스님의 다시 보는 금강경』을 읽다. (0) | 2021.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