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프롬 지음, 황문수 옮김(2023), 『사랑의 기술』, 서울: ㈜문예출판사, 1판 1쇄 1976. 6. 20., 5판 13쇄 2023. 1. 30.
2023년 7월 30일(일)에 에릭 프롬(Erich Fromm)의 『사랑의 기술』(The Art of Loving』을 읽었다. 1970년대 후반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어 보게 되었다. 같은 책을 50년 만에 다시 읽게 되었다. 한참 젊었던 시절에 읽었을 때의 기분은 전혀 기억이 없지만, 아마도 사랑의 테크닉(Technique) 측면에서 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사랑의 아트(Art) 측면에서 읽어 보기로 했다.
이 책은 너무나 유명한 책이라 독후감을 올린다는 것이 쑥스러운 일이지만, 50여 년만에 읽는 소감은 어떨까 궁금하면서 책을 열어본다. 도서관의 서가에서 우연히 에 책을 보고 같은 생각으로 책을 빌리게 되었다.
에릭 프롬의 마지막 조수를 지낸 라이너 풍크(Rainer Funk) 박사가 책 출간 50주년을 맞아 ‘출간 50주년에 부처’라는 글이 이 책의 말미에 수록되어 있다. 풍크 박사에 의하면, 1956년에 발간된 『The Art Of Loving』은 1955년 말에서 1956년 초까지 집필한 책이라고 한다. 두 번의 결혼 실패 후에 앨라배마 출신의 미망인 애니스 프리먼과 1953년 12월에 세 번째로 결혼한 후에 집필한 책이다. 위대한 철학자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말년에 쓴 사랑하기(Loving) 기술인 셈이다. 풍크 박사는 “사랑처럼 엄청난 희망과 기대 속에서 시작되었다가 반드시 실패로 끝나고 마는 활동이나 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은 에릭 프롬 자신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한다.
머리말에서 저자는 사랑의 기술에 대한 편리한 지침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실망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사랑은 스스로 도달한 성숙도와는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탐닉할 수 있는 감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 이 책의 의도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요에 해당하는 제1장에서는 사랑은 기술인가라는 주제를 피력하고, 제2장 사랑의 이론, 제3장 현대 서양 사회에서 사랑의 붕괴, 제4장 사랑의 실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다른 기술을 습득할 때처럼 이론의 습득과 실천의 습득 과정을 거쳐야 하며, 세 번째 요인은 곧 기술 숙달이 궁극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제2장에서는 사랑의 이론은 인간실존론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전제하여, 부모와 자식의 사랑, 모성애, 성애, 자기애, 신에 대한 사랑 등을 논하고 있다. 본래 사랑은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다. 사랑은 한 사람과, 사랑의 한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계 전체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태도 곧 ‘성격의 방향’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제4장에서 살의 실천을 강조한다. 사랑의 기술 분야에서 명장이 되려는 야망을 사람은 누구든지 삶의 모든 국면을 통해 훈련. 정신 집중, 인내를 실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훈련은 훈련을 즐겁게 생각하고 훈련을 그만두면 결국 실패될 행동에 천천히 익숙해지는 것이 본질적이라고 말한다. 정신 집중은 우리 문화에서는 실행하기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다.
사랑은 겸손, 객관성, 이성의 발달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에 전 생애를 바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끝으로 “내가 입증하려고 노력한 바와 같이, 사랑만이 인간의 실존 문제에 대한 건전하고 만족스러운 대답이라면, 상대적으로나마 사랑의 발달을 배제하는 사회는 인간성의 기본적 필연성과 모순을 일으킴으로써 결국 멸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사랑을 위해서는 겸손과 객관성 및 이성의 발달을 요구한다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다. 좋든 싫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사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덕목이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의지의 행위, 곧 나의 생명을 다른 한 사람의 생명에 완전히 위임하는 결단의 행위여야 한다는 말에 공감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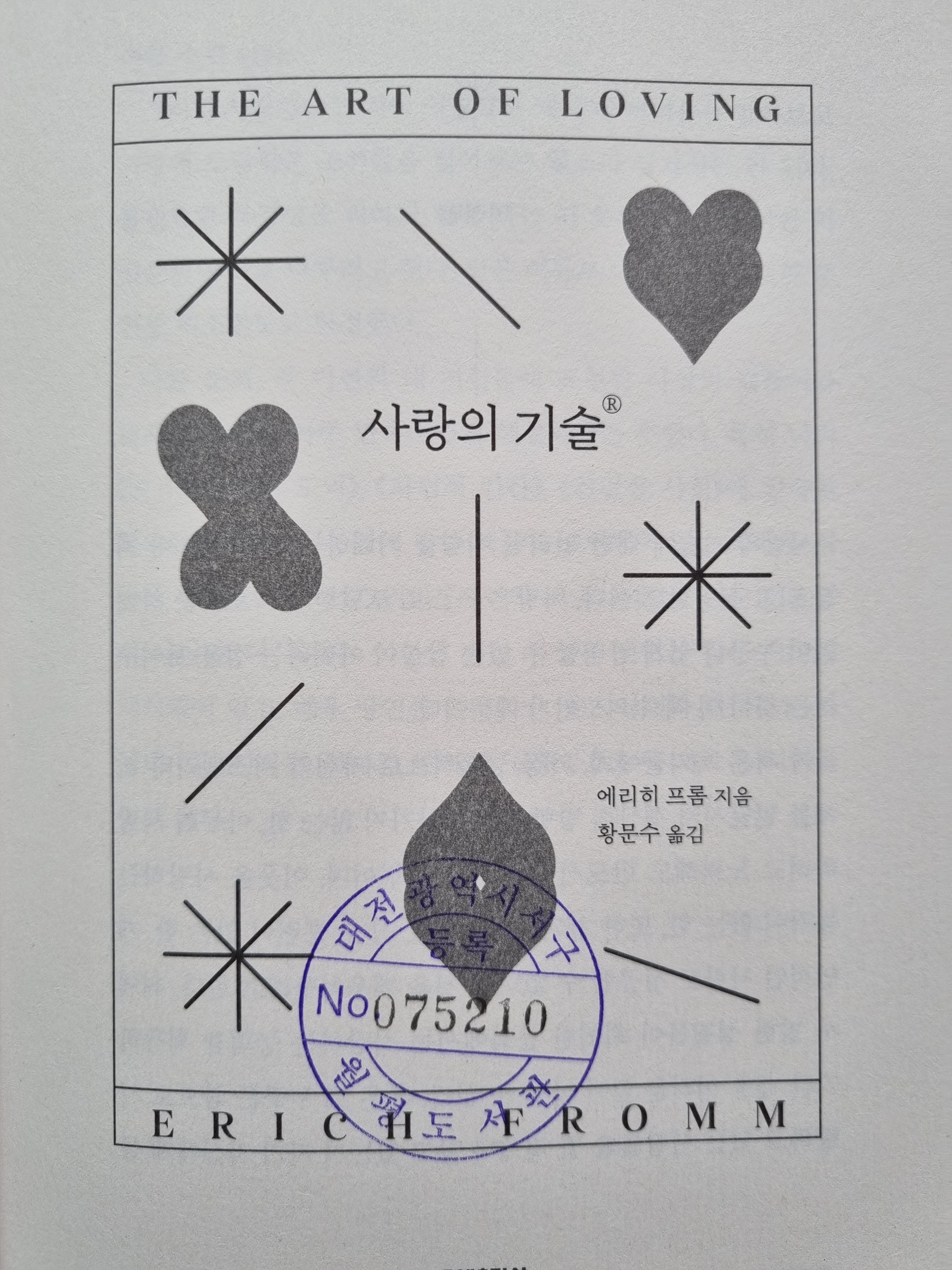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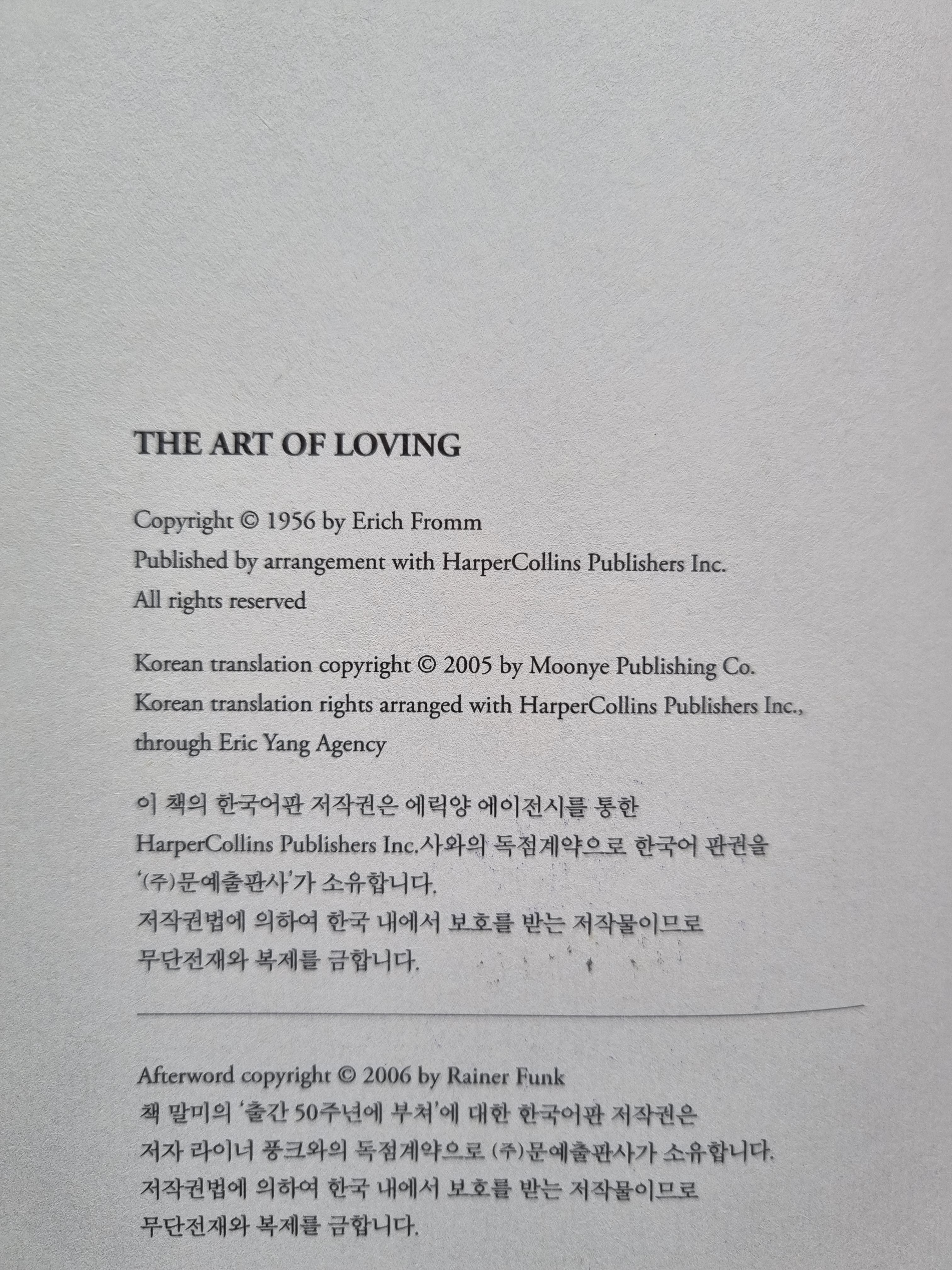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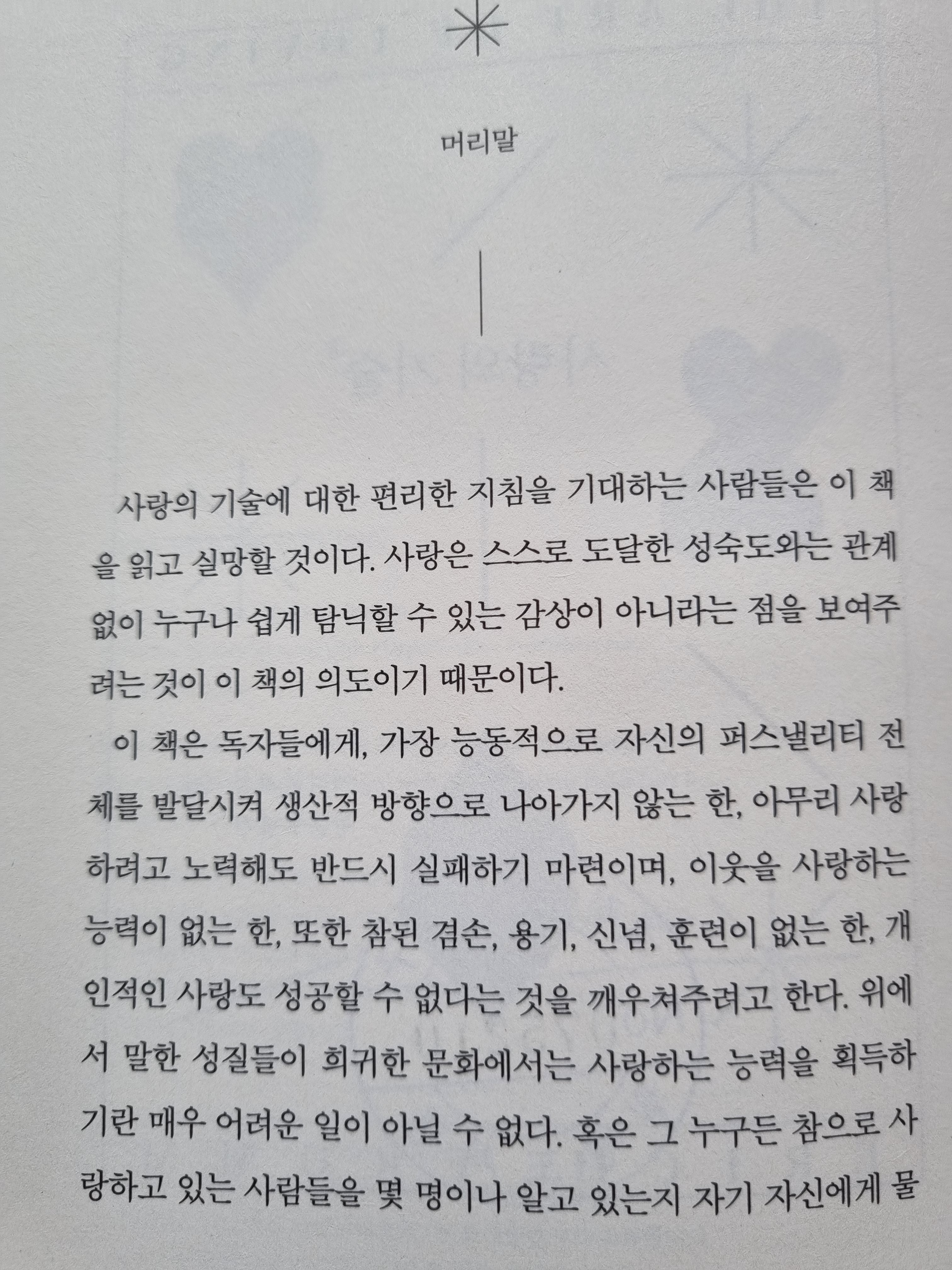




'배움의 기쁨 > 책속의 한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루쉰의 『아Q정전』을 읽다. (2) | 2023.08.26 |
|---|---|
| 앤드류 젠킨슨 지음, 『식욕의 과학』을 읽다. -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은 이 책을 먼저 읽으시길~~. (0) | 2023.08.15 |
| 김승호(2023), 『마흔에 혼자 읽는 주역인문학 – 깨달음 실천편』을 읽다. (0) | 2023.07.30 |
| 마크 버트니스의 『문명의 자연사』를 읽다. (0) | 2023.07.30 |
| 『모든 것의 기원』을 읽다. (0) | 2023.07.29 |